법정스님의 두번째 법문집 - '한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사람을'에 수록된 세번째 법문 '마음속 금강보좌에 앉으라' ㉡ 번째 내용입니다. 본 법문은 2006년 12월 5일 겨울안거 결제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 '마음 속 금강보좌에 앉으라'의 첫번째 내용입니다!
[법정스님 법문 - 한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사람을] 3. 마음속 금강보좌에 앉으라:㉠
법정스님의 두번째 법문집 - '한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사람을'에 수록된 세번째 법문 '마음속 금강보좌에 앉으라' ㉠ 번째 내용입니다. 본 법문은 2006년 12월 5일 겨울안거 결제에서 하신 말씀
ostornados.com
■ 마음 속 금강보좌에 앉으라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고통과 불만족을 느낍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가는 사람들도 조금만 내면을 들추면 고통과 불만족에 찬 하소연을 늘어놓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고 세상에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모든 것은 변화한다.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란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상함의 진리에 대한 자각은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이제 어떤 짐도 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생존 시 유마힐(維摩詰)이라는 거사(집에서 머물며 수행하는 불교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도 중부 바이살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이살리가 현재는 외지고 낙후된 곳이지만, 그 당시는 상업이 번창한 도시국가여서 매우 부유하고 사람들로 붐비며 음식이 풍부한 도시였습니다. 7천 개의 놀이터와 그만큼의 연못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자이나교의 창시자 마하비리가 이곳 왕족 출신이어서 자이나교의 본고장이라 불립니다. 신라 혜초 스님의 {왕오천축국전}은 앞부분이 없어지고 바이살리에 대한 묘사부터 시작되는데, "땅은 모두 평평하고 노예가 없다. 사람을 팔면 살인하는 죄와 다르지 않다."고 적고 있습니다.
바이살리는 인도에서 최초로 공화제가 실시된 곳이기도 합니다. 바지안 연합이라고 하는 인류 최초의 공화국입니다. 불교 교단에서는 경전의 제2결집(경전 편집회의)이 그곳에서 행해졌고, 최초로 여성의 출가를 받아들인 곳이 바이살리 였습니다. 그만큼 그곳은 다른 곳에 비해서 진보적인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옛터에 그대로 아소카 왕의 석주가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부처님의 여름안거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유마경]이 설해진 무대로도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어느 때 유마 거사는 병석에 눕게 됩니다. 이때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병문안을 다녀오라고 했는데, 일찍이 유마 거사에게 당했던 일을 들추면서 다들 사양합니다. [유마경]은 이런 내용으 극단적으로 구성한 독특한 경전입니다. 경전에서 유마 거사는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나도 아프다. 중생의 아픔이 나으면 내병도 나을 것이다. 보살의 병은 오로지 자비심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명상해 봐야 할 말입니다. 남을 위해 대신 아플 수 있는 경계는 어떤 것일까?
보살의 병이 자비심에서 생긴다면, 그럼 중생의 병은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요? 중생의 병은 그가 짓는 업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업보중생'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수행자(광엄동자)가 한적한 장소에서 정진하고 싶어서 그런 장소를 찾아 성 밖으로 나갑니다. 그때 마침 유마거사가 어딘가 다녀오는 길에 그와 마주칩니다.
수행자가 묻습니다.
"거사님, 어디에 갔다가 오시는 길입니까?
유마거사의 답입니다.
"수행도량에서 오는 길입니다."
그 수행자는 마침 한적하고 조용한 도량을 찾고 있던 참이라 반기면서 묻습니다.
" 그 도량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때 유마거사가 한 대답입니다.
"직심시도량直心是道량", 곧은 마음이 도량이지요. 그곳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곧은 마음, 때묻지 않은 순수한 마음, 정직한 마음, 분별과 집착을 떠난 마음이 곧 도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량을 밖에 있는 어떤 특정한 장소로 착각하지 말라는 소식입니다.
임제스님은 말합니다.
"시끄러움을 피해 따로 고요를 찾는 것은 외도의 짓이다."
육조 혜능 스님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걷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언제나 곧은 마음으로 하라."
[유마경은 말합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국토가 깨끗하다."
[천수경]에도 나오는 "늘 보리심을 지니면 가는 곳마다 극락세계이다."라는 말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지금도 북인도 보드가야의 대탑 앞에 가면 대리석으로 만든 연꽃무늬의 금강보좌(金剛寶座)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그곳에 앉아서 성불했다고 전해지는데, 그 당시 실제로 금강보좌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록에 의하면 단지 풀을 깔고 앉아서 명상했습니다. 이 풀은 그위에서 부처님이 깨달음에 이르렀다고 해서 후에 길상초라고 불리게 됩니다. 단지 그 자리를 기념하기 위해 후대에 대리석으로 조각해 금강보좌를 만들어 놓은 것뿐입니다.
금강보좌란 무엇입니까? 다이아몬드로 만든 자리,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단단한 보석과 같은 자리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죽어도 좋으니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리라.'라는 결심 자체가 금강과 같은 보좌를 이룬 것입니다.
금강보좌는 인도 보드가야의 보리수나무 아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마다의 마음속에 각자의 금강보좌가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은 의지와 집념, 금강석으로 된 자신만의 보좌가 있어야 합니다.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마음 밖에서 따로 찾지 마십시오! 이와 같은 곧은 마음으로 이번 안거를 맞이한다면 큰 깨침이 있을 것입니다. 부지런히, 꾸준히, 그리고 침묵 속에 정진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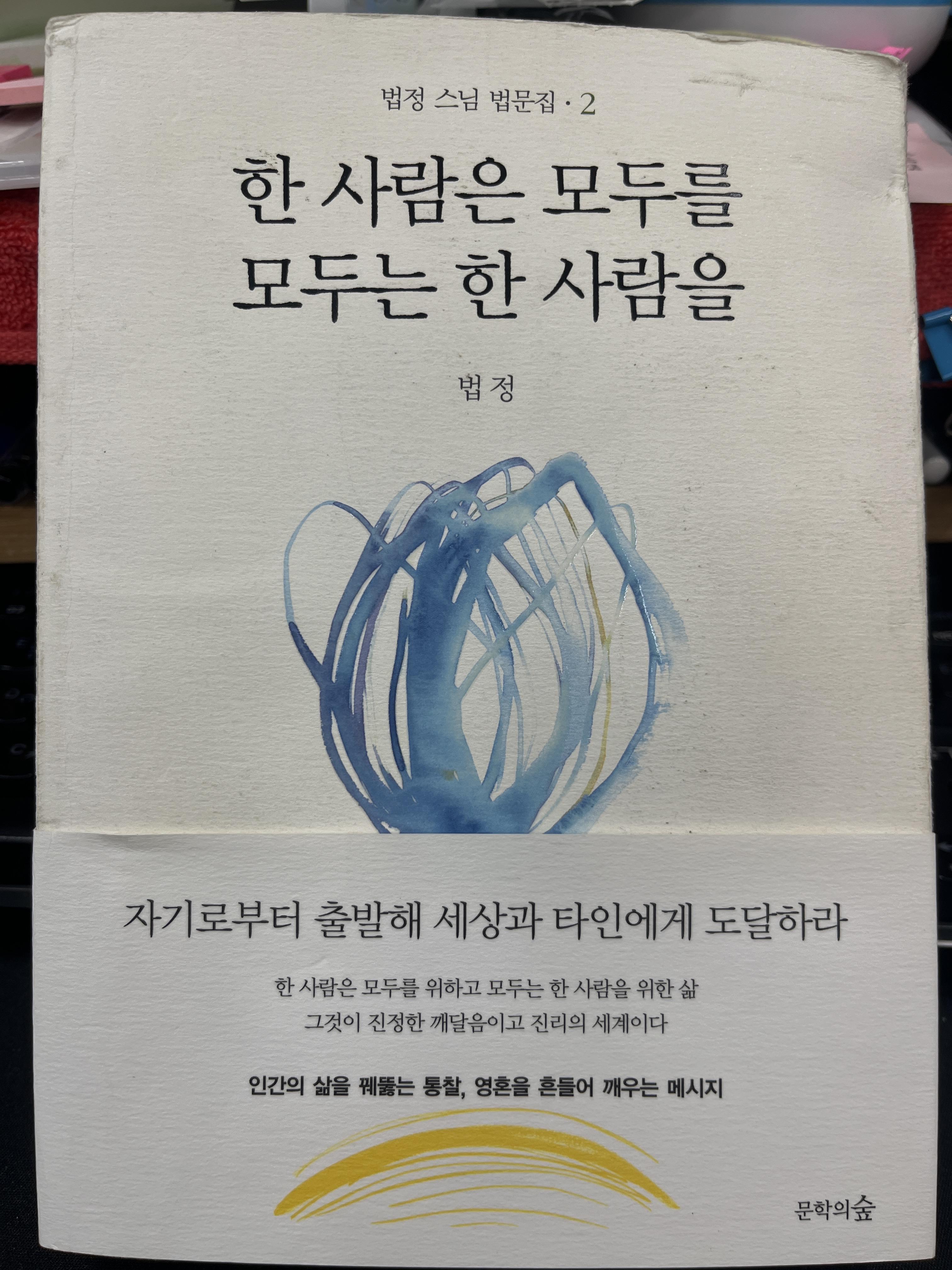
'법정스님 법문집'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법정스님 법문] 4. 영원한 것 없으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0) | 2024.06.26 |
|---|---|
| [법정스님 법문 - 한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사람을] 3. 마음속 금강보좌에 앉으라:㉠ (0) | 2024.06.22 |
| [법정스님 법문-한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사람을] 2. 소욕지족 소병소뇌 (0) | 2024.06.21 |
| [법정스님 법문-한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사람을] 1. 부처님 옷자락을 붙잡아도 (0) | 2024.06.18 |



